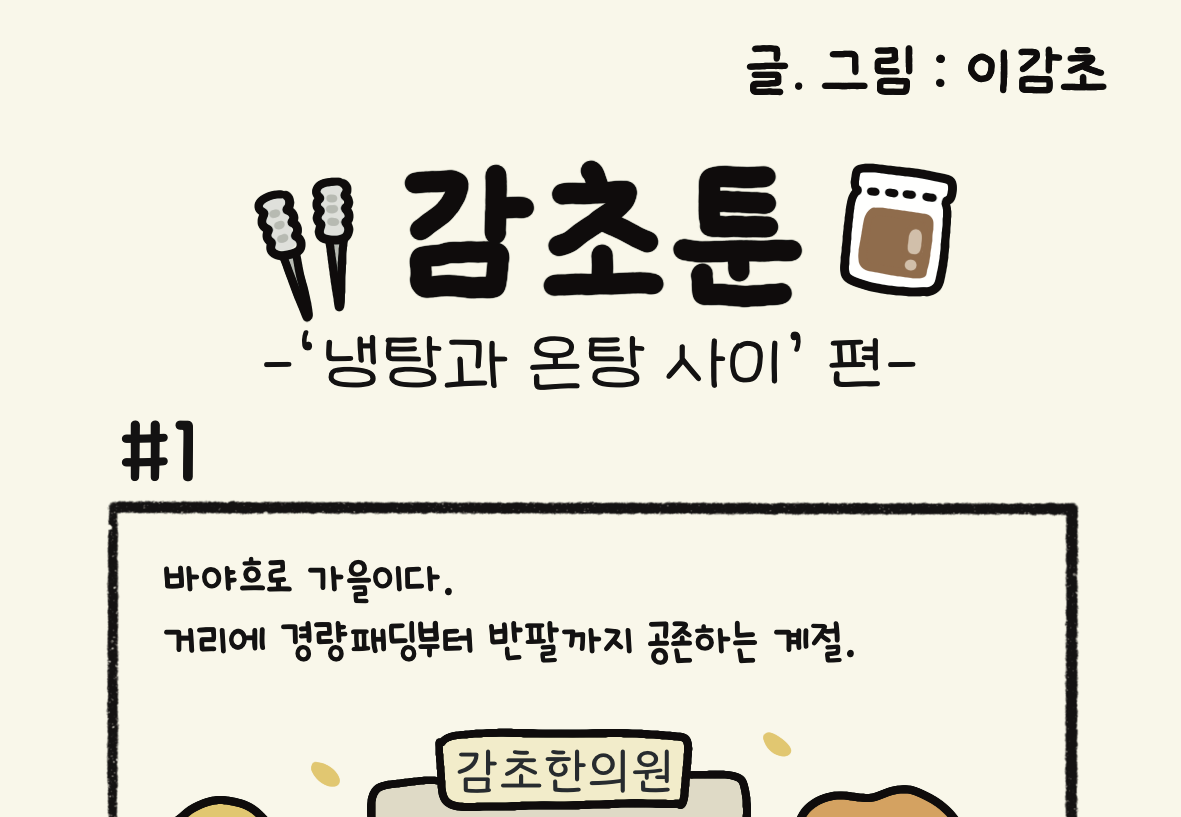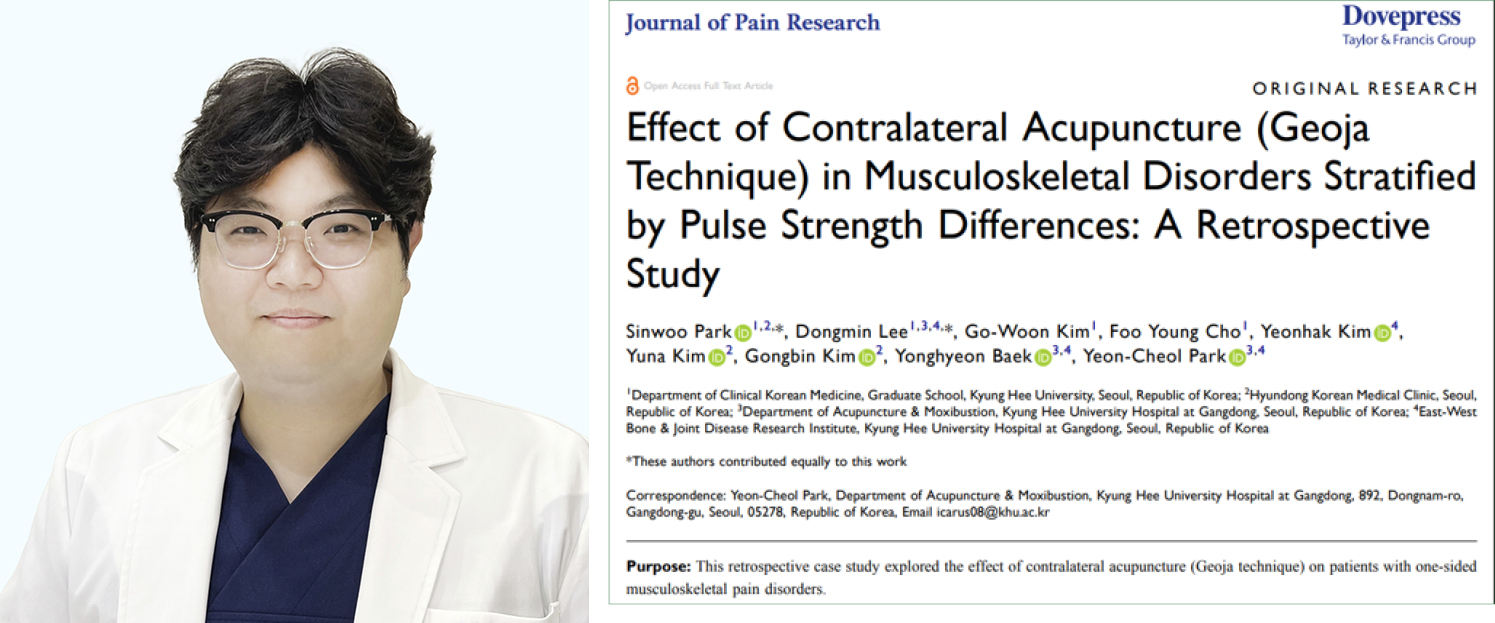속초0.0℃
속초0.0℃ -2.2℃
-2.2℃ 철원-2.4℃
철원-2.4℃ 동두천-1.8℃
동두천-1.8℃ 파주-3.0℃
파주-3.0℃ 대관령-7.0℃
대관령-7.0℃ 춘천-0.6℃
춘천-0.6℃ 백령도0.0℃
백령도0.0℃ 북강릉-0.4℃
북강릉-0.4℃ 강릉0.8℃
강릉0.8℃ 동해0.9℃
동해0.9℃ 서울-0.5℃
서울-0.5℃ 인천-1.4℃
인천-1.4℃ 원주-1.3℃
원주-1.3℃ 울릉도0.3℃
울릉도0.3℃ 수원-2.3℃
수원-2.3℃ 영월-1.8℃
영월-1.8℃ 충주-1.7℃
충주-1.7℃ 서산-1.9℃
서산-1.9℃ 울진-0.1℃
울진-0.1℃ 청주0.2℃
청주0.2℃ 대전-0.2℃
대전-0.2℃ 추풍령-0.7℃
추풍령-0.7℃ 안동-1.1℃
안동-1.1℃ 상주-0.1℃
상주-0.1℃ 포항2.5℃
포항2.5℃ 군산-1.3℃
군산-1.3℃ 대구1.7℃
대구1.7℃ 전주-0.2℃
전주-0.2℃ 울산1.6℃
울산1.6℃ 창원3.3℃
창원3.3℃ 광주1.0℃
광주1.0℃ 부산3.1℃
부산3.1℃ 통영3.7℃
통영3.7℃ 목포0.8℃
목포0.8℃ 여수3.3℃
여수3.3℃ 흑산도1.9℃
흑산도1.9℃ 완도0.9℃
완도0.9℃ 고창-1.6℃
고창-1.6℃ 순천0.3℃
순천0.3℃ 홍성(예)-0.9℃
홍성(예)-0.9℃ -2.5℃
-2.5℃ 제주5.3℃
제주5.3℃ 고산4.5℃
고산4.5℃ 성산2.4℃
성산2.4℃ 서귀포5.5℃
서귀포5.5℃ 진주3.2℃
진주3.2℃ 강화-1.4℃
강화-1.4℃ 양평-0.3℃
양평-0.3℃ 이천-1.6℃
이천-1.6℃ 인제-3.3℃
인제-3.3℃ 홍천-1.3℃
홍천-1.3℃ 태백-5.1℃
태백-5.1℃ 정선군-2.7℃
정선군-2.7℃ 제천-2.1℃
제천-2.1℃ 보은-2.0℃
보은-2.0℃ 천안-2.4℃
천안-2.4℃ 보령-3.0℃
보령-3.0℃ 부여-1.6℃
부여-1.6℃ 금산-1.1℃
금산-1.1℃ -0.8℃
-0.8℃ 부안-1.5℃
부안-1.5℃ 임실-1.8℃
임실-1.8℃ 정읍-1.1℃
정읍-1.1℃ 남원-0.6℃
남원-0.6℃ 장수-3.4℃
장수-3.4℃ 고창군-1.9℃
고창군-1.9℃ 영광군-1.1℃
영광군-1.1℃ 김해시2.4℃
김해시2.4℃ 순창군-1.4℃
순창군-1.4℃ 북창원2.8℃
북창원2.8℃ 양산시1.9℃
양산시1.9℃ 보성군1.9℃
보성군1.9℃ 강진군2.0℃
강진군2.0℃ 장흥0.8℃
장흥0.8℃ 해남0.2℃
해남0.2℃ 고흥1.8℃
고흥1.8℃ 의령군1.6℃
의령군1.6℃ 함양군1.0℃
함양군1.0℃ 광양시1.7℃
광양시1.7℃ 진도군-0.8℃
진도군-0.8℃ 봉화-2.6℃
봉화-2.6℃ 영주-1.4℃
영주-1.4℃ 문경-1.0℃
문경-1.0℃ 청송군-0.7℃
청송군-0.7℃ 영덕1.3℃
영덕1.3℃ 의성0.0℃
의성0.0℃ 구미-0.3℃
구미-0.3℃ 영천1.0℃
영천1.0℃ 경주시1.8℃
경주시1.8℃ 거창-0.2℃
거창-0.2℃ 합천3.1℃
합천3.1℃ 밀양2.0℃
밀양2.0℃ 산청1.1℃
산청1.1℃ 거제2.8℃
거제2.8℃ 남해3.9℃
남해3.9℃ 0.7℃
0.7℃
2026년 02월 01일 (일)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gWjQvmYX_208ec3d22cca3c4dabe0690736cb02fecca2d1b0.jpg)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pWMfBulG_1f19604ef50b802d08e2eba88760392f36a0c023.jpg)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9aoWOQ7J_f562bba0ac6cd1fa3cb3e0cfa693448832494455.jpg)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KopJVa4A_3c6f4bbb06b1e87364c53423365ed86fb200850b.jpg)

![[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07/2039300137_tzacLJfB_2f59361a10063749b72d0e25ccb1a8ab9fe13f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