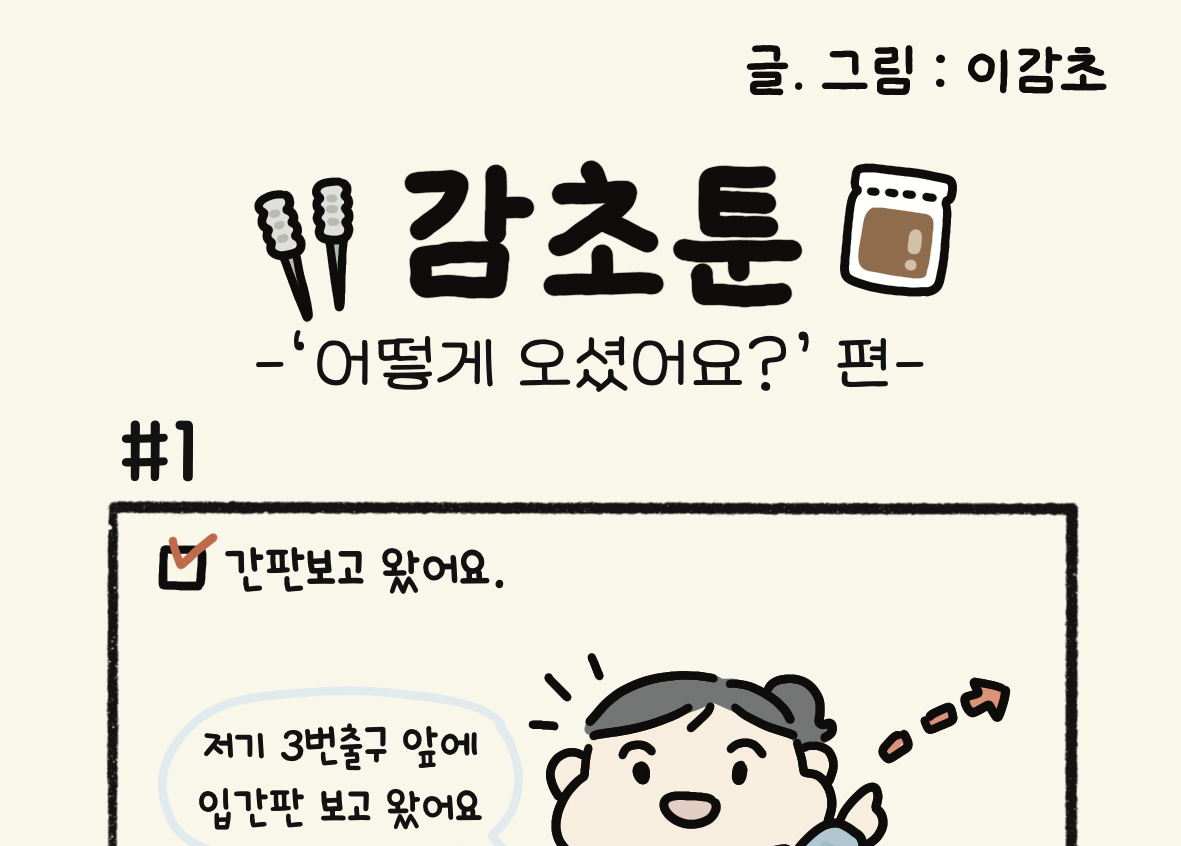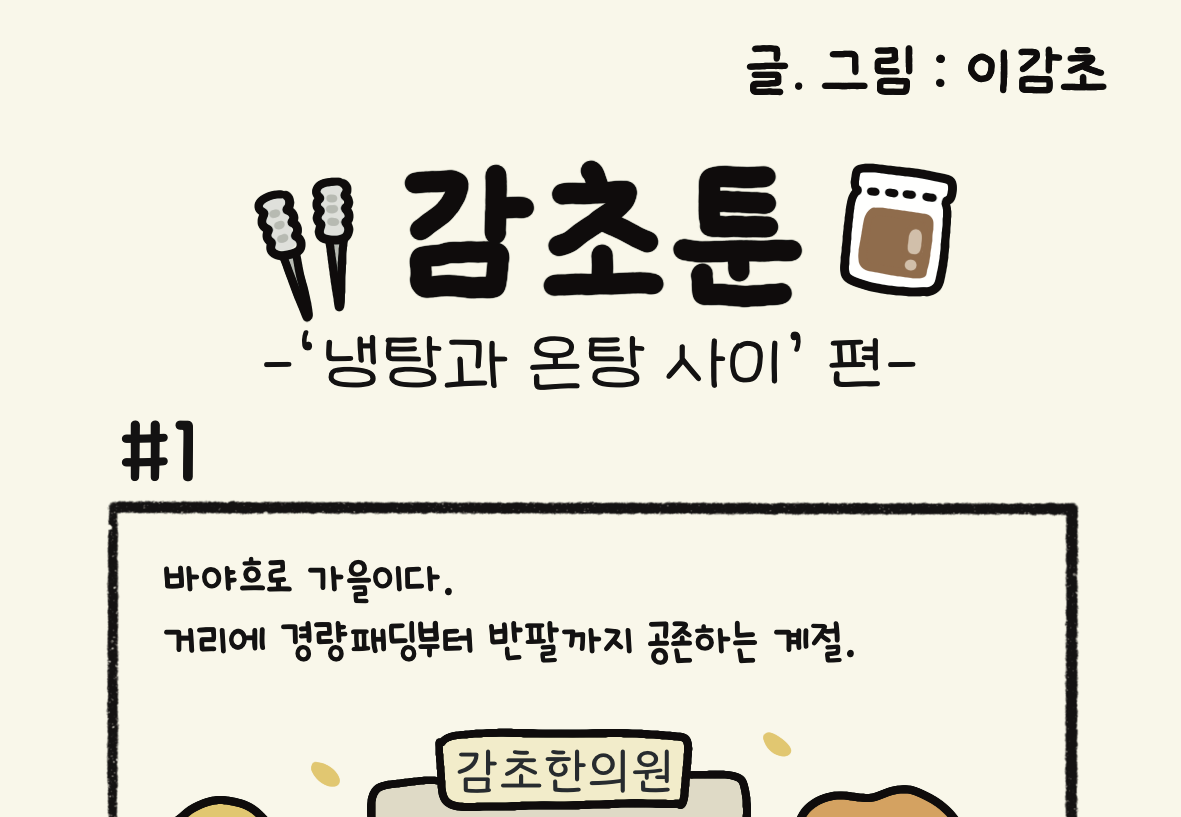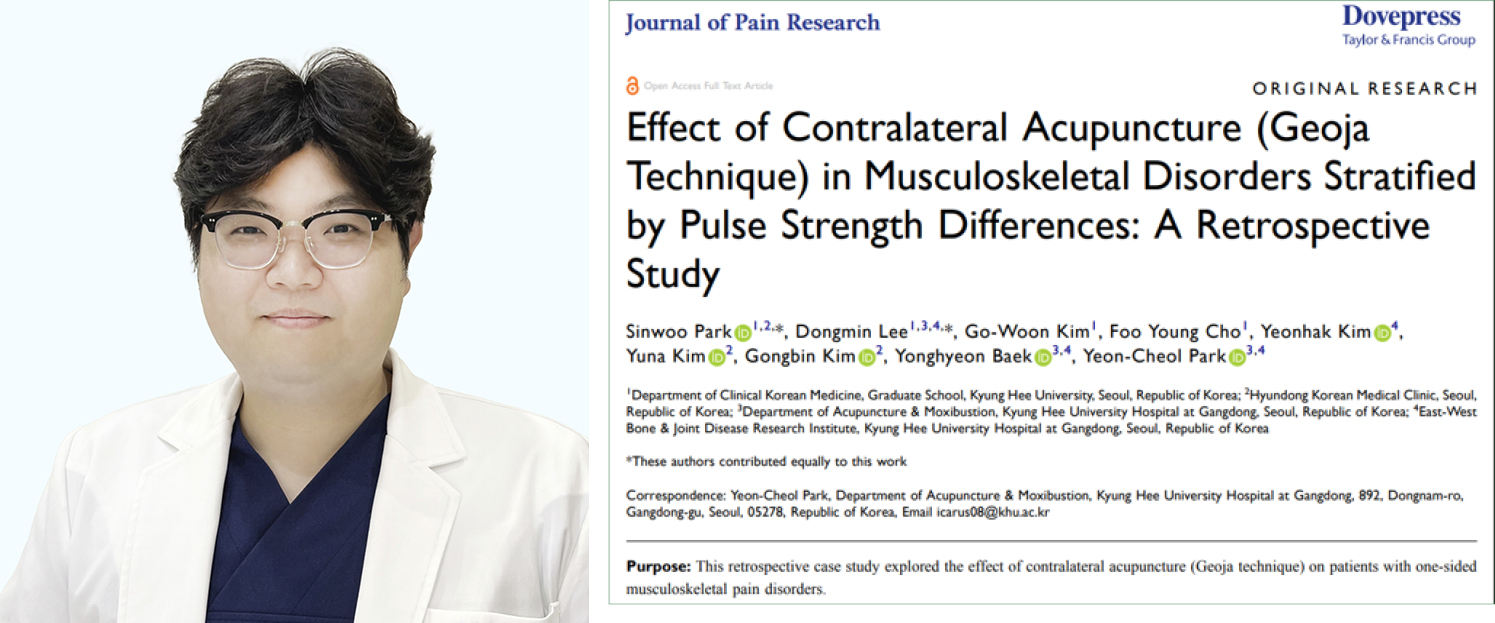김태우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한의원의 인류학 : 몸-마음-자연을 연결하는 사유와 치유> 저자
닭이 아닌 치킨
“관계”는 생명 이해에 있어 핵심적이다. 생명과 생명 사이의 관계가, 관계 맺는 생명들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치킨용 닭의 관계가 닭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에 대한 가까운 예다. 그 관계가 닭이라는 존재를 규정한다. 인간-닭 관계 속에서 닭은 생명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미약한 존재다. 생명의 명(命)이 뜻하는, 존재 이유를 가진 물(物)라는 의미가 무색하다. 생명이라기보다는 생명이 가진 대사, 성장 기능을 인간이 이용하는 대상이다. 닭 모이가 바로 치킨이 되지는 않지만, 닭은 사료와 물을 먹고 치킨 살을 한 달 안에 “생산”한다. 그 생산 가능성이 인간과 치킨 관계를 규정한다.
한국사회에서 닭이 치킨이 되고부터1) 닭에 부여해온 의미들도 변화했다. 아침을 알리는 닭의 이미지는 이제 없다. 민주주의를 상징하던 닭의 울음도 들어본 지 오래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토트넘의 상징도 닭이지만, 장닭의 용맹을 내세우지만, 치킨 공화국 한국에서는 이제 닭이 스포츠팀의 상징이 되기는 어렵다. 상대 팀이 얕볼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지는, 닭과 인간의 관계가 존재의 의미를 규정한다.
하나가 아닌 관계“들”
인간과 닭의 관계에서 인간은 세계의 중심에 있는 존재다. 치킨용 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은 모든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에 있어왔다. 바다거북, 쑥부쟁이, 북극 빙하, 남극 펭귄, 땅속 석유, 바다 속 플라스틱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이다. 이 “인간 중심”에서 먼 존재들은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인간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 가치의 기준은 줄곧 인간에의 이로움이다. 스스로 자라는 살고기로서만 치킨 닭의 가치는 규정된다.
관계가 존재를 규정한다. 생명들의 관계가 생명을 규정한다. 인간과 치킨 관계의 예시가 규정의 힘을 말하고 있다. 이 예시가 드러내는 관계의 방식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체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개체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말하는, 관계 이해의 방식이다. 개체가 먼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세상의 모든 관계 이해 방식의 전부는 아니다. 관계를 앞에 두면 어떻게 될까? 관계가 먼저고 개체가 뒤로 가면 어떤 관계의 방식이 드러날까?
동아시아의 존재 이해에서는 그러한 다른 관계의 예시를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이해의 방식에선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 어렵지 않게 파악된다. 음양, 사시, 육기 등 한의학의 키워드에도 관계를 중심에 두는 사유가 관철되어 있다. 단백질, DNA, 호르몬 같은 개별체들이 서양의학의 생명 개념의 키워드를 이루는 데 반해, 개별체를 내세우지 않는 음양, 사시, 육기 개념이 동아시아의학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차이나는 생각의 방식을 예시한다.
음양(陰陽)은 동아시아 관계 중심의 사유를 구체화한다. 음양이 하늘땅[天地], 수화(水火), 기혈(氣血)에 있다. 여기선 하늘과 땅, 수와 화, 그리고 기와 혈 사이 관계가 중요하다.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올랐다내려갔다, 들어갔다나왔다, 펼쳤다오무렸다, 움직였다쉬었다 밝았다어두웠다, 차가웠다따뜻했다, 길었다짧았다... 이들 움직임에는 변화가 도정되어 있다.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변화한다. 움직임과 변화는, 하지만 과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으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생명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칙은 당연하다. 그래서 음양은 생명적인 것2)에서 피할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생명적인 것을 빼고 음양을 말할 수는 없다.
음양의 이치를 공유하는 “생명적인 것”의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음양과 같은, 만물에 공유된 이치는, 그 관계 속에서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공유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의학의 논리로 기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인류세의 한의학> 글 시리즈가 가능한 이유이다), 기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생리병리를 논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음양은 발견의 대상이 아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치는 발견의 대상이 아니다. 당연한 이치다. 누가 음양은 없다고 하더라고 생명 활동 안에 살아움직이고 있다. 음양이 없다거나, 관념적이라는 주장에는, 개별의 존재를 먼저 찾으려는 생각의 습벽이 깔려있다. 개체를 앞세우면 개체를 먼저 확인하려고 한다. 음양의 사유는 개체를 먼저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개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체 우선의 관계 이해 방식에서는, 인간과 같은 주도하는 개체가 자리잡게 된다. 개체가 먼저일 경우 이 주도하는 개체에 의해 관계가 규정되기 십상이다. 인간과 치킨용 닭의 관계에서와 같이, 하나의 생명(인간)은 그 관계를 주도하지만, 다른 생명(닭)은 그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음양은 관계 속에 있는 생명적인 것에 관한 사유다. 음양과 같은 관계의 논리를 중심에 두면, 주도하는 자가 필요하지 않다. 관계가 먼저다. 니나 내나 다 음양이다. 모두 생명이기 때문이다. 관계를 중심에 두는 것은 생명을 더 생명답게 한다. 생명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인류세”는 지금의 시대명으로 적절하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친 1750년대 즈음부터 인류는 본격적으로 탄소도 태웠지만, 본격적으로 생명들을, 존재들을 규정해 왔다. 인류세가 지금의 시대명인 것은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한 개체들 간의 관계 맺기와 깊이 연관된다. 인류세에, 주도권을 가진 인간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관심에서 다른 개체들을 규정하고 결정해왔다. 여기에선 생명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인류의 이득과 관심사가 중심에 있었다.

인류세, 지금의 시대와 존재를 규정하다
근현대라는 시대는 인간이라는 개체가 그 주도하는 존재로 떠오른 시대이다. 주도하는 개체가 존재하면, 생명들의 관계도 그 주도하는 개체와의 관계로 전유된다. 주도하는 개체가 중심에 있으면, 또한 연결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된 개체와 그 대상인 객체와의 단일 관계가 단선적으로 구성된 것이 세계를 이룬다. 그 단일 관계만 보게 한다. 인간-치킨용 닭의 관계만 보게 한다.
개체-개체의 관계만 보면 인간이 먹는 치킨만 생각하게 된다. 닭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닭축사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와의 관계에 눈멀게 한다. 공장식 축사에 갇힌 닭의 생명도 보이지 않는다.
먼 훗날 인류세를 조사할 고고학자들은 닭뼈를 수 없이 발굴할 것이라고 한다. 인류세와 치킨닭의 연결은 말이 된다. 인류세는 인간이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는 시대이지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인류가 가진 관점이 깔려 있다. 인간 중심의 관점이 배태되어 있다. 인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구조화한 시대다. 그러므로 인류세는 말이 된다. 그 결과는 세계의 쏠림이다. 닭 뼈, 아니 치킨 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바다 위 플라스틱의 섬 등 과도하게 쏠리는 상황이 된다. 이것이 인류세다.
인류세 너머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생각의 방식이 필요하다. 위기의 기후변화 속에서 “가이아”, “부엔비비르”, “녹색계급” 등 전에 없던 혁신적 언어와 사유가 제안되고 있다. “음양”과 같은 동아시아 사유도 혁신적이다.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다.
1) � 치킨(chicken)은 닭의 영어표현이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닭으로 만든 음식을 표현하는 보통 명사로 자리 잡았다. 영어에서, 소(cow)와 별개로 beef라고, 돼지(pig)와 별개로 pork라고 그 고기를 부르는 것과 비슷한 명명 방식이다. 한국어에서 그동안 동물명에 고기를 붙여 사용해오던 표현 방식(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과 차이나는 명명법이다. 음식이 된 “치킨”은 닭이라는 생명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2) �“생명적인 것”은 개별 존재를 상기하는 “생명”의 이미지를 우회하기 위한 이글의 단어 선택이다. 생명하면 우리는 까치, 송이버섯, 코뿔소 같은 개별 존재를 먼저 떠올린다. 개별 존재는 개별 생명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이해에서는 개별의 개체뿐만 아니라 생명들을 생명이게 하는 조건들, 즉 기후, 환경, 자연도 다 생명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생명의 거대한 장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생명적인 것”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또한, 관계가 먼저인 동아시아에서 개별 존재를 상기시키는 “생명”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생명적인 것” 혹은 “생명적인 것들의 장”이 동아시아의 관계 방식에서는 더 어울리는 말일 것이다. 말에는 세계와 존재를 이해하는 어떤 관성이 이미 내재해 있어서,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른 세계와 존재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류세 너머와 같은 기존의 생각의 습벽을 떠난 사유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말에 대한 고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속초-5.6℃
속초-5.6℃ -13.4℃
-13.4℃ 철원-14.3℃
철원-14.3℃ 동두천-12.4℃
동두천-12.4℃ 파주-14.0℃
파주-14.0℃ 대관령-14.2℃
대관령-14.2℃ 춘천-12.3℃
춘천-12.3℃ 백령도-4.5℃
백령도-4.5℃ 북강릉-5.7℃
북강릉-5.7℃ 강릉-3.9℃
강릉-3.9℃ 동해-5.1℃
동해-5.1℃ 서울-9.7℃
서울-9.7℃ 인천-9.1℃
인천-9.1℃ 원주-11.2℃
원주-11.2℃ 울릉도-0.7℃
울릉도-0.7℃ 수원-10.5℃
수원-10.5℃ 영월-13.3℃
영월-13.3℃ 충주-11.9℃
충주-11.9℃ 서산-7.5℃
서산-7.5℃ 울진-5.6℃
울진-5.6℃ 청주-7.8℃
청주-7.8℃ 대전-8.5℃
대전-8.5℃ 추풍령-7.4℃
추풍령-7.4℃ 안동-9.2℃
안동-9.2℃ 상주-6.7℃
상주-6.7℃ 포항-5.4℃
포항-5.4℃ 군산-6.7℃
군산-6.7℃ 대구-5.6℃
대구-5.6℃ 전주-5.9℃
전주-5.9℃ 울산-6.4℃
울산-6.4℃ 창원-4.7℃
창원-4.7℃ 광주-5.6℃
광주-5.6℃ 부산-4.9℃
부산-4.9℃ 통영-5.2℃
통영-5.2℃ 목포-1.1℃
목포-1.1℃ 여수-3.7℃
여수-3.7℃ 흑산도0.2℃
흑산도0.2℃ 완도-2.7℃
완도-2.7℃ 고창-4.0℃
고창-4.0℃ 순천-4.7℃
순천-4.7℃ 홍성(예)-8.9℃
홍성(예)-8.9℃ -11.2℃
-11.2℃ 제주2.2℃
제주2.2℃ 고산2.4℃
고산2.4℃ 성산1.3℃
성산1.3℃ 서귀포0.1℃
서귀포0.1℃ 진주-9.5℃
진주-9.5℃ 강화-11.4℃
강화-11.4℃ 양평-10.4℃
양평-10.4℃ 이천-10.9℃
이천-10.9℃ 인제-12.6℃
인제-12.6℃ 홍천-12.5℃
홍천-12.5℃ 태백-11.4℃
태백-11.4℃ 정선군-12.5℃
정선군-12.5℃ 제천-14.3℃
제천-14.3℃ 보은-12.2℃
보은-12.2℃ 천안-11.4℃
천안-11.4℃ 보령-7.3℃
보령-7.3℃ 부여-9.0℃
부여-9.0℃ 금산-10.2℃
금산-10.2℃ -8.4℃
-8.4℃ 부안-5.2℃
부안-5.2℃ 임실-7.0℃
임실-7.0℃ 정읍-6.7℃
정읍-6.7℃ 남원-8.9℃
남원-8.9℃ 장수-7.9℃
장수-7.9℃ 고창군-5.6℃
고창군-5.6℃ 영광군-3.8℃
영광군-3.8℃ 김해시-5.8℃
김해시-5.8℃ 순창군-9.3℃
순창군-9.3℃ 북창원-4.7℃
북창원-4.7℃ 양산시-2.7℃
양산시-2.7℃ 보성군-3.2℃
보성군-3.2℃ 강진군-2.4℃
강진군-2.4℃ 장흥-3.6℃
장흥-3.6℃ 해남-4.0℃
해남-4.0℃ 고흥-3.3℃
고흥-3.3℃ 의령군-11.1℃
의령군-11.1℃ 함양군-3.8℃
함양군-3.8℃ 광양시-3.8℃
광양시-3.8℃ 진도군-0.2℃
진도군-0.2℃ 봉화-8.5℃
봉화-8.5℃ 영주-7.5℃
영주-7.5℃ 문경-6.8℃
문경-6.8℃ 청송군-11.5℃
청송군-11.5℃ 영덕-6.1℃
영덕-6.1℃ 의성-12.3℃
의성-12.3℃ 구미-5.7℃
구미-5.7℃ 영천-6.4℃
영천-6.4℃ 경주시-5.7℃
경주시-5.7℃ 거창-9.5℃
거창-9.5℃ 합천-6.7℃
합천-6.7℃ 밀양-5.3℃
밀양-5.3℃ 산청-3.8℃
산청-3.8℃ 거제-3.7℃
거제-3.7℃ 남해-4.7℃
남해-4.7℃ -5.6℃
-5.6℃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gWjQvmYX_208ec3d22cca3c4dabe0690736cb02fecca2d1b0.jpg)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pWMfBulG_1f19604ef50b802d08e2eba88760392f36a0c023.jpg)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9aoWOQ7J_f562bba0ac6cd1fa3cb3e0cfa693448832494455.jpg)

![[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07/2039300137_tzacLJfB_2f59361a10063749b72d0e25ccb1a8ab9fe13f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