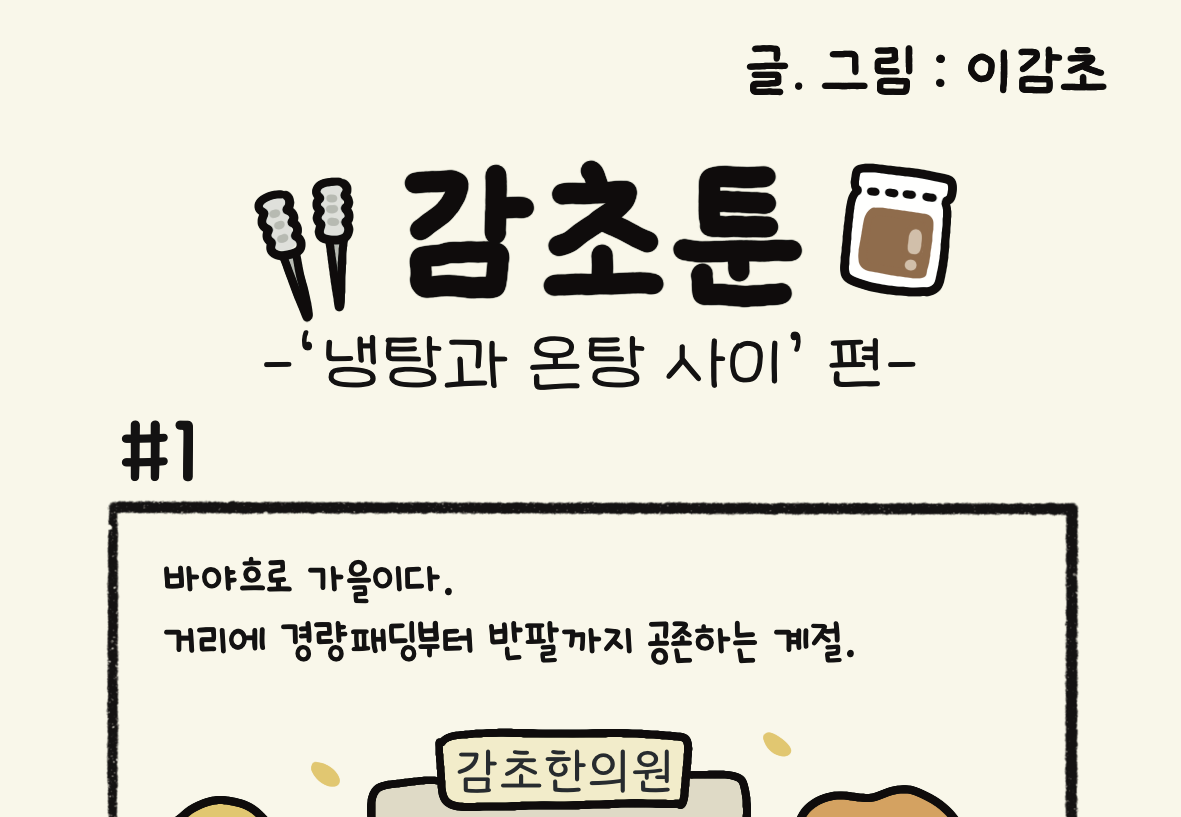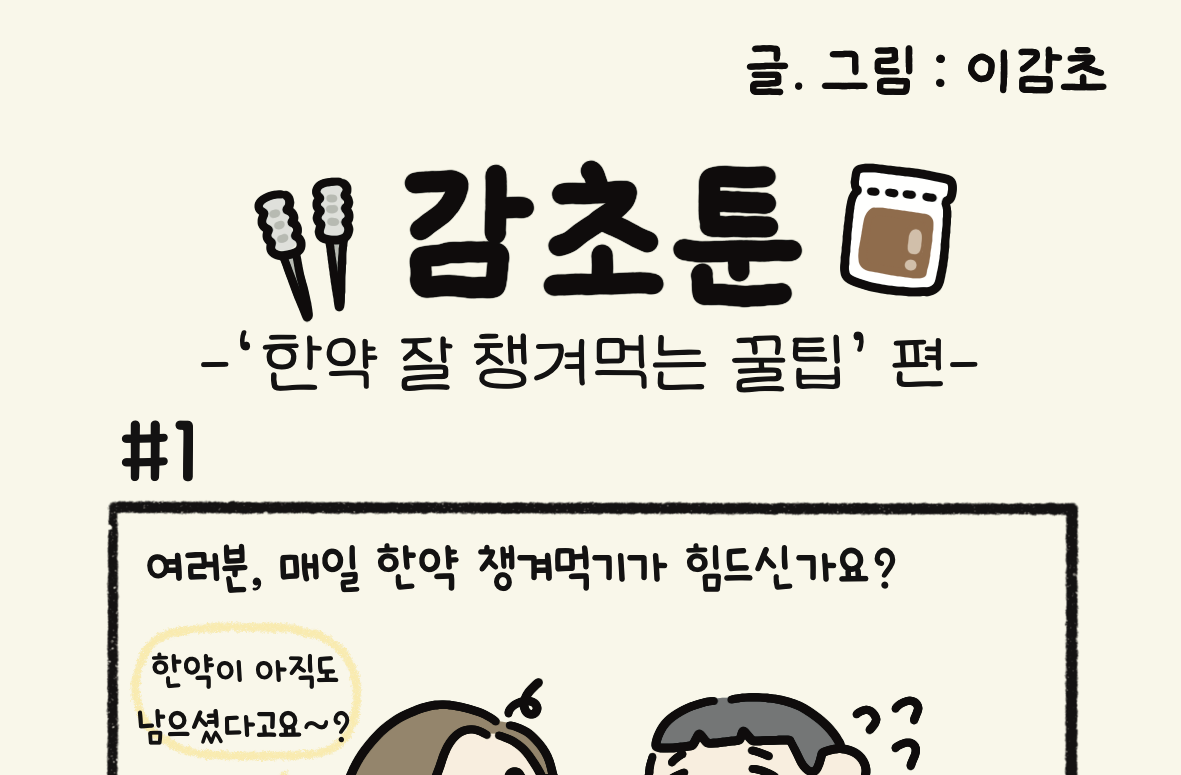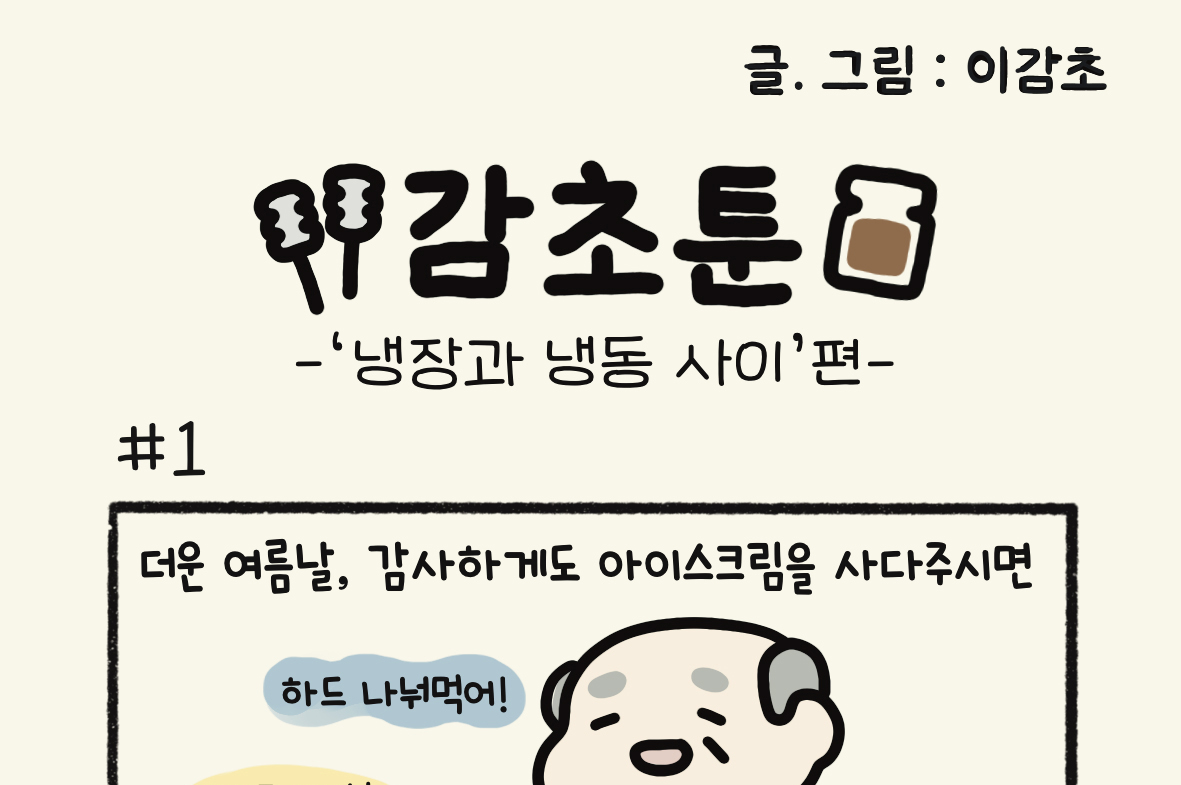고다원 학생(대전대 한의대 본과 4학년)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가 지난달 3일부터 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양기율시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에 운 좋게 학생 봉사자로 함께할 수 있었다. 본과 4학년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며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의 무게’를 체감하던 시기였기에 출국 전까지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체 전통의학을 계승·발전시켜 온 만큼 동양의학에 친숙하고 우호적인 나라다.
봉사활동이 진행된 양기율시는 수도 타슈켄트에서 약 20km 떨어진 인구 21만 명 규모의 도시로,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다.
이번 봉사단은 현지 주민과 교민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 약침 등 첨단 한의학 치료를 선보이며, 현지 의료계와 환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소통의 벽을 넘은 200명의 만남”
필자는 예진(問診) 파트를 맡아 현지 통역사와 함께 약 200명의 환자를 만났다.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간 예진 질문지를 손에 들고 시작했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예상보다 컸다.
의료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통역사와의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고, 급할 때는 ChatGPT와 구글 번역기, 이미지 검색까지 동원해야 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오히려 소중한 추억이 됐다.
현지의 대부분 환자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꾸준히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혈압이 높을 때만 약을 먹거나 아예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흔했다.
현지의 생활환경을 듣고 나니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유목문화의 잔재로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즐기면서도 도시화로 활동량은 줄었고, 단 음료와 가공식품의 섭취가 늘어났다.
여기에 높은 진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병원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진행된 의료봉사는 환자들에게 단순한 진료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낯선 한방치료임에도 침, 약침, 한약, 추나를 거리낌 없이 받고,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시술을 마치고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는 환자들의 표정에서, 한의의료봉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진정한 진료는 환자 삶의 길을 비추는 것”
이번 봉사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순간은 한 뇌성마비 환아를 만났을 때였다. 아이는 청각장애와 경직, 불면 등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예진 후, 아이가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님께 진료받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이원구 회장님은 “이 아이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각과 청각이 모두 저하돼 외부 자극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 중 하나로 관절을 움직여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보호자에게 알려주셨다.
보호자는 “지난 8월 KOMSTA 봉사 이후 아이의 증상이 호전돼 다시 찾아왔다”며 “침 치료를 계속 받으면 완전히 나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 회장님은 완치보다는 증상 관리의 중요성을 차분히 설명하며 환자가 더 나은 일상을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 장면을 보며 ‘진료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일’임을 깊이 느꼈다.

“환자의 눈빛에서 배운 한의사의 길”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봉사는, 환자들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들 덕분에 끝내 감사함으로 마무리되었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부족했던 점도 많았다. 하지만 낯선 환경 속에서 수백 명의 환자와 마주하고 직접 예진에 참여했던 경험은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배움이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는 단순한 해외 봉사가 아니라, ‘한의사로서의 길’을 스스로 묻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환자를 만나더라도 그들의 눈빛 속에서 다시 이때의 마음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속초2.1℃
속초2.1℃ -7.4℃
-7.4℃ 철원-5.2℃
철원-5.2℃ 동두천-4.5℃
동두천-4.5℃ 파주-6.3℃
파주-6.3℃ 대관령-8.9℃
대관령-8.9℃ 춘천-6.2℃
춘천-6.2℃ 백령도6.2℃
백령도6.2℃ 북강릉0.4℃
북강릉0.4℃ 강릉2.1℃
강릉2.1℃ 동해1.0℃
동해1.0℃ 서울-1.9℃
서울-1.9℃ 인천0.0℃
인천0.0℃ 원주-6.8℃
원주-6.8℃ 울릉도4.0℃
울릉도4.0℃ 수원-2.3℃
수원-2.3℃ 영월-8.1℃
영월-8.1℃ 충주-7.7℃
충주-7.7℃ 서산-2.7℃
서산-2.7℃ 울진0.8℃
울진0.8℃ 청주-3.0℃
청주-3.0℃ 대전-3.1℃
대전-3.1℃ 추풍령-2.8℃
추풍령-2.8℃ 안동-5.3℃
안동-5.3℃ 상주-2.6℃
상주-2.6℃ 포항0.6℃
포항0.6℃ 군산-3.1℃
군산-3.1℃ 대구-1.5℃
대구-1.5℃ 전주-2.4℃
전주-2.4℃ 울산-0.4℃
울산-0.4℃ 창원0.9℃
창원0.9℃ 광주-1.0℃
광주-1.0℃ 부산2.4℃
부산2.4℃ 통영0.2℃
통영0.2℃ 목포0.1℃
목포0.1℃ 여수0.9℃
여수0.9℃ 흑산도4.1℃
흑산도4.1℃ 완도-0.8℃
완도-0.8℃ 고창-3.9℃
고창-3.9℃ 순천-5.8℃
순천-5.8℃ 홍성(예)-4.2℃
홍성(예)-4.2℃ -5.7℃
-5.7℃ 제주4.2℃
제주4.2℃ 고산4.9℃
고산4.9℃ 성산3.6℃
성산3.6℃ 서귀포8.8℃
서귀포8.8℃ 진주-4.1℃
진주-4.1℃ 강화-1.3℃
강화-1.3℃ 양평-5.8℃
양평-5.8℃ 이천-6.6℃
이천-6.6℃ 인제-4.6℃
인제-4.6℃ 홍천-5.6℃
홍천-5.6℃ 태백-4.6℃
태백-4.6℃ 정선군-8.5℃
정선군-8.5℃ 제천-9.3℃
제천-9.3℃ 보은-6.8℃
보은-6.8℃ 천안-6.2℃
천안-6.2℃ 보령-2.9℃
보령-2.9℃ 부여-4.7℃
부여-4.7℃ 금산-5.9℃
금산-5.9℃ -3.5℃
-3.5℃ 부안-2.0℃
부안-2.0℃ 임실-5.8℃
임실-5.8℃ 정읍-4.0℃
정읍-4.0℃ 남원-5.4℃
남원-5.4℃ 장수-7.6℃
장수-7.6℃ 고창군-4.0℃
고창군-4.0℃ 영광군-3.3℃
영광군-3.3℃ 김해시-1.0℃
김해시-1.0℃ 순창군-5.1℃
순창군-5.1℃ 북창원-0.9℃
북창원-0.9℃ 양산시0.3℃
양산시0.3℃ 보성군-4.1℃
보성군-4.1℃ 강진군-3.5℃
강진군-3.5℃ 장흥-5.2℃
장흥-5.2℃ 해남-5.3℃
해남-5.3℃ 고흥-4.8℃
고흥-4.8℃ 의령군-6.9℃
의령군-6.9℃ 함양군-6.4℃
함양군-6.4℃ 광양시-0.9℃
광양시-0.9℃ 진도군-3.2℃
진도군-3.2℃ 봉화-8.2℃
봉화-8.2℃ 영주-5.7℃
영주-5.7℃ 문경-4.0℃
문경-4.0℃ 청송군-8.2℃
청송군-8.2℃ 영덕0.0℃
영덕0.0℃ 의성-7.6℃
의성-7.6℃ 구미-3.4℃
구미-3.4℃ 영천-3.3℃
영천-3.3℃ 경주시-5.1℃
경주시-5.1℃ 거창-7.0℃
거창-7.0℃ 합천-4.6℃
합천-4.6℃ 밀양-4.2℃
밀양-4.2℃ 산청-5.0℃
산청-5.0℃ 거제-0.7℃
거제-0.7℃ 남해0.6℃
남해0.6℃ -4.3℃
-4.3℃









![[자막뉴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개](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1/990852453_sZe8qrSG_7e230c1cbeebc4cbde8cec6a32ca9706a4284105.jpg)
![[자막뉴스] 한의사의 레이저 국소마취제 활용은 '합법'](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1/990852453_sfab7vrl_33eba149666249edcd87064b2ed4efb96506b17f.jpg)
![[자막뉴스] 각 지역 특성 살려 한의약 육성 계획 추진](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1/990852453_I1rBAk7d_f3b06ec77f325427a6cdd35aad05812b1d2554e2.jpg)
![[자막뉴스] 한의진료 보장 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1/990852453_YuT9QS6A_aa357fc96d70718865b613b105f5857705194083.jpg)
![[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07/2039300137_tzacLJfB_2f59361a10063749b72d0e25ccb1a8ab9fe13f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