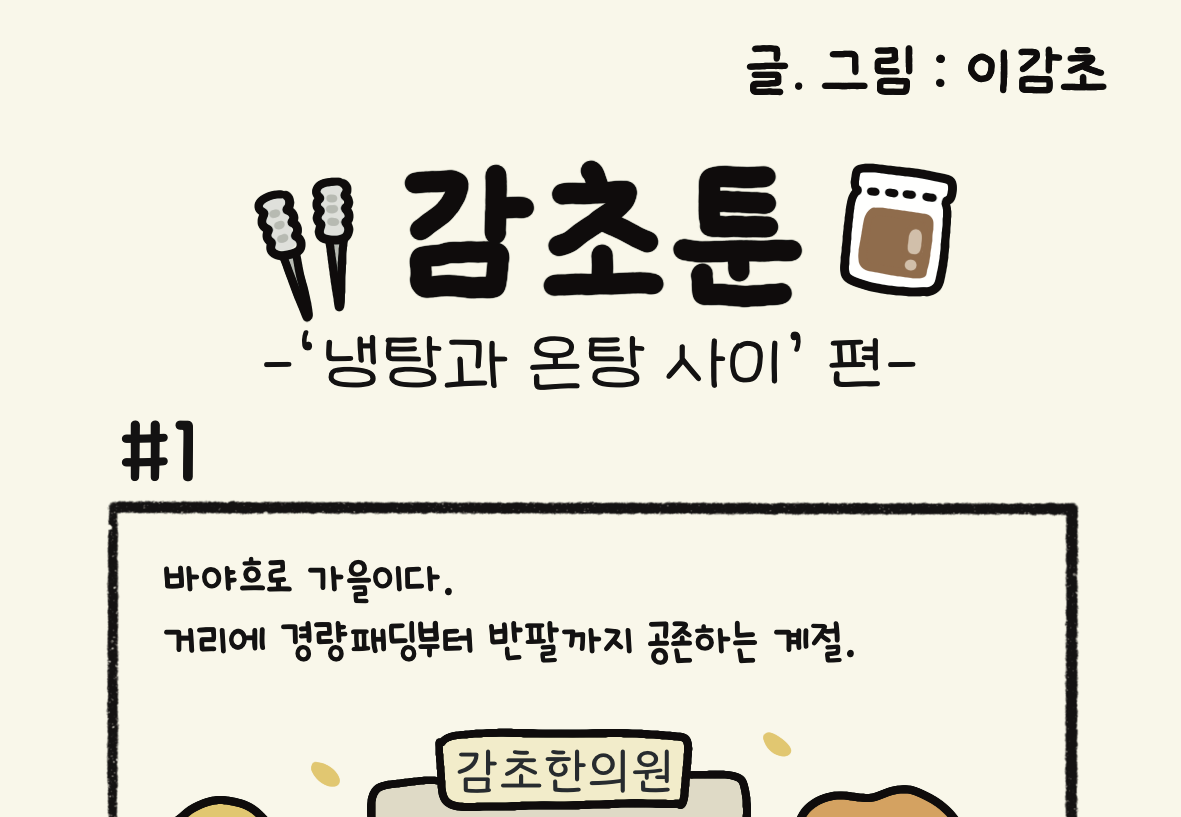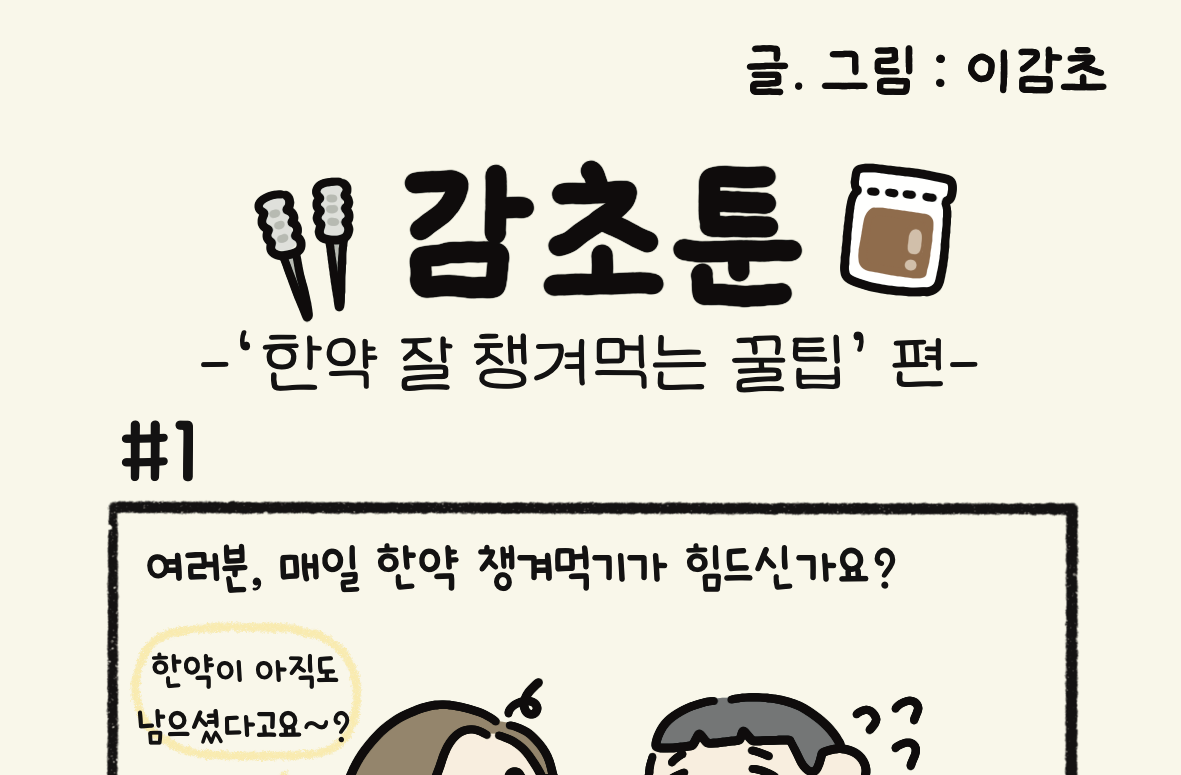김보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1학년)
그 중 한 분은 나중에 비행기 고장으로 일정이 하루 미뤄진 진료단을 위해 별장으로 식사 초대를 해주셨다. 별장도 넓고 아름다웠지만 한쪽에 별도로 설치된 러시아식 사우나는 우리가 받은 최고로 따뜻한 선물이었다.
공식적인 진료가 끝나고 우리가 방문한 곳은 코프샤코프 ‘망향의 언덕’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었다. 동행한 르포 작가이신 남해경 박사님으로부터 이곳에서 마지막 귀국선을 타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늘어섰다는 얘기들과 그때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의 통곡소리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몇 날 몇 일 잠을 잘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잠시 목이 메었다.
이어서 들른 곳은 한인 1세들이 많이 묻힌 공동묘지. 오는 길에 사온 꽃으로 헌화를 하고 김일권 원장님이 써주신 시를 낭독하고 잠시 묵념을 했다. 이곳은 비석에 얼굴 사진을 새겨 넣고, ‘학생 000지 묘’라고 쓰는 특징이 있었는데, 입구 쪽의 화려함과 달리 까마귀가 머리 위로 울며 날아다니는 깊은 곳에는 풀이 무성하고 찾기도 힘든 더 많은 묘가 있었다. 그 중 우리가 발걸음을 멈춘 곳이 우연히도 우리를 인솔해주시던 한인 분의 아버지의 묘이었고, 시를 낭독하고 묵념을 하는 동안 아버지를 부르는 그 분의 눈물에 우리는 뒤늦게, 이제야 찾아뵌다는 죄송스럽고 아픈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예정된 마지막날 저녁, 한의사협회 진주환 부회장님, 그리고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대우건설 사장님과 함께한 사할린주 외교부 장관 초청 만찬까지 모든 일정이 끝나고 아쉬워하는 가운데, 사할린 항공의 비행기가 ‘technical problem’으로 귀국 일정이 불확실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화도 인터넷도 할 수 없었던 일주일. 해진 이후로는 외출을 할 수 없었고, 더군다나 진료 중에서는 아랄리아 요양원 밖을 한번도 나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우선 이수진 회장님의 도움으로 이산가족협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집으로 기회를 가졌다.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정말 사할린에 있구나 하는 생각과 나는 몇 일 늦더라도 돌아갈 수 있으니 다행이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SAT의 문제가 길어지면 아시아나와 협정으로 아시아나를 탈 수도 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더 늦더라도 아시아나를 타고 오라는, 전화하는 당시로는 웃을 수 없는 부탁도 잊지 않으셨다.
다행일까 불행일까. 사할린에 한의사로서 동포들을 위해 뼈를 묻어야 한다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가 지났고, 다음날 우리는 SAT를 타고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 사할린시간 19:35 비행기. 한국시간 20:35 도착. 시차는 두 시간.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잠시 시내 중심가를 둘러보고 오호츠크해에 발을 담궜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 우리와 동행하며 공항가는 마지막까지 도와주신 이수진 회장님과 김부자 선생님을 포함한 통역 분들의 푸근한 미소, 그리고 우리를 따라다니며 사진 찍어주고 장난치던 꼬마 사샤의 눈물이 마음에 박혔다. 세시간 거리인데 한번 오기가 이렇게 힘들었다니…. ‘꼭 다시 오겠습니다.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피곤한 몸보다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몸과 마음의 피로에 깜박 잠이 들었다. 하지만 정말 작은 비행기 SAT의 흔들림과 얼마전 일어난 러시아 비행기 사고, 그리고 대포동이 떠올라 곧바로 깼다. 두리번거리다 뒤를 돌아보니 녹색병원의 박재만 선생님께서는 글쓰기에 한참 집중하고 계신다.
우리는 무사히 인천에 도착했다. 공항의 화려함이 한국임을 실감하게 했다. 짐을 찾고, 진료하던 매일 아침 화이팅을 외치던 때처럼 다시 한번 둥글게 모여서 박재만 선생님께서 쓰신 ‘사할린 동포에게 보내는 글’을 들으며 감상의 끝에 잠시 젖었다.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 동포를 고국의 품으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우리 마음 속의 사할린은 러시아 사우나만큼이나 따뜻하고 비록 부자유로부터 시작했지만, ‘스스로 말미암은’ 자유를 만들어가는 곳이 되었다.
 속초5.3℃
속초5.3℃ -1.0℃
-1.0℃ 철원-1.1℃
철원-1.1℃ 동두천0.6℃
동두천0.6℃ 파주-0.4℃
파주-0.4℃ 대관령-1.0℃
대관령-1.0℃ 춘천-0.6℃
춘천-0.6℃ 백령도7.4℃
백령도7.4℃ 북강릉3.2℃
북강릉3.2℃ 강릉4.9℃
강릉4.9℃ 동해3.7℃
동해3.7℃ 서울2.3℃
서울2.3℃ 인천4.2℃
인천4.2℃ 원주-0.1℃
원주-0.1℃ 울릉도6.2℃
울릉도6.2℃ 수원2.1℃
수원2.1℃ 영월-0.6℃
영월-0.6℃ 충주0.3℃
충주0.3℃ 서산2.7℃
서산2.7℃ 울진3.2℃
울진3.2℃ 청주2.5℃
청주2.5℃ 대전1.3℃
대전1.3℃ 추풍령-1.8℃
추풍령-1.8℃ 안동-3.2℃
안동-3.2℃ 상주-1.0℃
상주-1.0℃ 포항2.1℃
포항2.1℃ 군산3.0℃
군산3.0℃ 대구-2.0℃
대구-2.0℃ 전주3.8℃
전주3.8℃ 울산0.2℃
울산0.2℃ 창원2.2℃
창원2.2℃ 광주2.8℃
광주2.8℃ 부산3.3℃
부산3.3℃ 통영2.9℃
통영2.9℃ 목포3.2℃
목포3.2℃ 여수4.7℃
여수4.7℃ 흑산도8.7℃
흑산도8.7℃ 완도1.6℃
완도1.6℃ 고창2.2℃
고창2.2℃ 순천-3.0℃
순천-3.0℃ 홍성(예)1.8℃
홍성(예)1.8℃ 0.4℃
0.4℃ 제주6.7℃
제주6.7℃ 고산11.3℃
고산11.3℃ 성산5.3℃
성산5.3℃ 서귀포8.3℃
서귀포8.3℃ 진주-3.3℃
진주-3.3℃ 강화1.7℃
강화1.7℃ 양평0.5℃
양평0.5℃ 이천-0.6℃
이천-0.6℃ 인제-0.2℃
인제-0.2℃ 홍천-0.8℃
홍천-0.8℃ 태백1.0℃
태백1.0℃ 정선군℃
정선군℃ 제천-0.3℃
제천-0.3℃ 보은-1.1℃
보은-1.1℃ 천안1.4℃
천안1.4℃ 보령5.2℃
보령5.2℃ 부여0.5℃
부여0.5℃ 금산-0.2℃
금산-0.2℃ 1.5℃
1.5℃ 부안5.3℃
부안5.3℃ 임실0.1℃
임실0.1℃ 정읍3.4℃
정읍3.4℃ 남원-0.5℃
남원-0.5℃ 장수-1.0℃
장수-1.0℃ 고창군3.6℃
고창군3.6℃ 영광군1.4℃
영광군1.4℃ 김해시0.6℃
김해시0.6℃ 순창군-0.3℃
순창군-0.3℃ 북창원1.2℃
북창원1.2℃ 양산시0.3℃
양산시0.3℃ 보성군0.3℃
보성군0.3℃ 강진군-0.8℃
강진군-0.8℃ 장흥-2.0℃
장흥-2.0℃ 해남-0.7℃
해남-0.7℃ 고흥-2.0℃
고흥-2.0℃ 의령군-5.4℃
의령군-5.4℃ 함양군-3.4℃
함양군-3.4℃ 광양시2.2℃
광양시2.2℃ 진도군1.5℃
진도군1.5℃ 봉화-5.2℃
봉화-5.2℃ 영주-2.1℃
영주-2.1℃ 문경-1.2℃
문경-1.2℃ 청송군-6.0℃
청송군-6.0℃ 영덕0.2℃
영덕0.2℃ 의성-4.7℃
의성-4.7℃ 구미-2.5℃
구미-2.5℃ 영천-4.1℃
영천-4.1℃ 경주시-3.2℃
경주시-3.2℃ 거창-5.0℃
거창-5.0℃ 합천-2.5℃
합천-2.5℃ 밀양-2.8℃
밀양-2.8℃ 산청-3.5℃
산청-3.5℃ 거제1.3℃
거제1.3℃ 남해1.0℃
남해1.0℃ -2.2℃
-2.2℃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gWjQvmYX_208ec3d22cca3c4dabe0690736cb02fecca2d1b0.jpg)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pWMfBulG_1f19604ef50b802d08e2eba88760392f36a0c023.jpg)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9aoWOQ7J_f562bba0ac6cd1fa3cb3e0cfa693448832494455.jpg)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KopJVa4A_3c6f4bbb06b1e87364c53423365ed86fb200850b.jpg)
![[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https://www.akomnews.com/data/photo/2507/2039300137_tzacLJfB_2f59361a10063749b72d0e25ccb1a8ab9fe13f47.jpg)